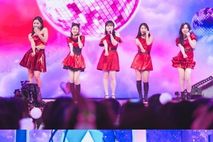미래사회, 사회적경제와 창조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정책 4p] 장건 이사장.jpg](http://ksen.co.kr/files/attach/images/39050/224/017/da293bd1b371a7d467ba52c3d04fa43f.jpg)
장 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우리나라 대통령은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이나 할 것 없이 늘 정책의 일번으로 내세우는 것이 경제이다. 경제만 잘하면 세상은 좋아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으로 안다. 모든 국정 철학이 ‘사람’에게 우선하지 않고 ‘자본(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돈을 빼면 과연 세상은 무너질까? 한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세 달이 되었다. 현 정부는 정책의 주요과제로 창조경제를 통한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메커니즘에 의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치닫다, 이제 그만 탐욕의 기관차는 낭떠러지 앞에 멈춰 섰다. 방향조차 돌리기 어려운 절벽 같은 제로 성장시대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미래사회 대안은 무엇일까?
미래를 얘기하는 정치지도자나 경제학자들에게 있어 제로 성장은 금기된 단어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분배를 말하면서도 큰 방향은 언제나 ‘성장’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성장이 멈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상상하기를 꺼린다. 성장이 멈추면 당장 성장을 토대로 구축된 생산ㆍ소비ㆍ금융ㆍ사회시스템(사회안전망)이 붕괴한다.
제로 성장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정책이다. 이것의 한 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사회적경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사회적경제란? “공통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민간단체, 상호공제조합 등 이윤추구 보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서비스와 공익을 우선하며 자율적인 경영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익 분배 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위에 두는 경제”를 말한다.
이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정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우리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언뜻 쉬운 말 같지만 간단치 않은 개념이다. 창조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 불분명하다.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투자 활성 등 벤처 창업 환경조성 ▲융자에서 투자방식으로의 금융지원 전환 ▲공공 조달 부문서 신제품 차별금지 검토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세부과제를 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또는 창조경제 어느 경제든지 간에 이제는 인간의 속에 살아 있는 상호 배려와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과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 생산-교환-분배-소비가 지역에서 순환하는 경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가진 보다 근본적인 경제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